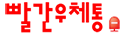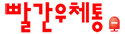언론보도 우리 동네 우체통 어디 있지? 2008-07-15(뉴스메이커)
2008.07.10 22:28
[우정이야기]우리 동네 우체통 어디 있지? 2008 07/15 뉴스메이커 783호
디지털 시대 우체통은 특이한 존재다. 있을 때는 좀처럼 거들떠보지 않지만 사라지면 모든 이가 아쉬워한다. 일 년 열두 달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은 느낌을 안겨주기 때문일까. 우체통만큼은 누구도 쓸데없이 많으니 구조조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투자에 비해 효용이 없는 시설을 마냥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체통 하나를 운용하려면 설치 비용 5만 원 외에 연간 유지·보수비 7500원이 든다. 여기에 하루 한 번씩 우체통을 열어보려면 자동차 기름값에 집배원 인건비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찾은 우체통에 편지 한 통 없다면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조조정을 재촉하지 않아도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체통의 급감세는 통계 숫자로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2005년 3만 개에서 2006년 2만7317개, 2007년 2만5547개로 해마다 2500~3000여 개가 없어진다. 우체통이 가장 많던 1993년(5만7000여 개)에 비하면 절반 이상이 이미 사라졌다.
독도에 설치돼 있는 우체통. --->>>
우체통의 존폐는 원칙적으로 우체국장 재량이다. 우체통에 들어 있는 편지가 하루 3통 미만인 경우가 석 달 이상 지속될 때 폐쇄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현재 우체통 하나에 들어 있는 평균 편지 수는 12.7통. 재작년 17.1통, 지난해 13.4통에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평균이 이 정도니 외딴 농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의 우체통에는 하루 3통은커녕 한 통도 없는 경우도 많다. 자고 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우체통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 어쩌다 찾으려면 위치를 몰라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 검색창에는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하는 식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런 사람은 몇 년 만에 처음 편지를 부치는 것임에도 “우체통 찾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고 당당하게 짜증을 낸다. 왜? 소비자가 왕이니까.
하지만 이런 까탈스러운 소비자도 오는 10월이면 달라질 것 같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통 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이때부터 전국에 걸쳐 서비스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지식 검색에 물어볼 필요 없이 지역체신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하면 되는 것이다. 우편배송팀 박기섭 사무관은 “기존 지도에 우체통 위치를 적시해 보여주는 개념으로 전국 우체통 지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체통은 어떨까. 네이버에 들어가 ‘우체통’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우체통을 제목 또는 주제로 삼은 시(詩)와 노래는 물론 우체통 음식점, 술집, 펜션 등이 줄줄이 나온다.
“말없이 우뚝섰는/ 새빨간 우체통/ 내 말 좀 들어요/ 사랑하는 그 님에게/ 내 편지 전해줘요 그렇게 있지 말고.”
록의 대부 신중현이 1964년에 발표한 우체통이란 노래다. 우체통이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도맡아하던 시대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2003년 나온 도종환의 시 ‘우체통’도 눈에 띈다.
“그들이 사랑을 시작한 강가에는/ 키가 작은 빠알간 우체통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섶다리를 건너갔다 건너오며 사랑이 익어가고/ 물안개 피어오르는 하늘을 넘어 남자의 편지가 가고/ 저녁 물소리로 잠든 창문을 두드리는 여자의 답장이/ 밤마다 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체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틋한 마음을 이어준다는 우체통의 의미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설령 우체통 속에 편지가 없어도 강가에, 언덕 위에, 또는 길모퉁이에 오롯이 서 있는 존재감만으로 정감을 자아내는 것이다.
우체통은 따뜻한 어감 때문에 상호로도 종종 이용된다. 음식점 ‘우체통’은 네이버에 나오는 것만 서울에 3곳, 전국적으로 5곳이 있고, 펜션으로는 ‘빨간우체통’이 2곳, ‘노란우체통’이 1곳 있다. 우체통을 매일 방문하는 집배원들이 경기 안양지역에서 만든 빨간우체통(www.coreapost.com)이란 봉사단체도 눈길을 끈다.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jtlee@kyunghyang.com
-출처 뉴스메이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제 10회 우체국행복나눔 봉사대상 최우수상 | 관리자 | 2025.06.30 | 3 |
| » |
우리 동네 우체통 어디 있지? 2008-07-15(뉴스메이커)
| 아주 | 2008.07.10 | 2503 |
| 3 | 안양우체국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2007-06-29 (내일신문) | 관리자 | 2008.07.11 | 2272 |
| 2 |
'지역 지킴이' 안양우체국 집배원들 2006-04
| 관리자 | 2008.07.11 | 2275 |
| 1 |
안양 우체국 집배원들 ‘사랑 배달기’ 2006-03-06 (경기일보)
| 관리자 | 2008.07.11 | 2360 |